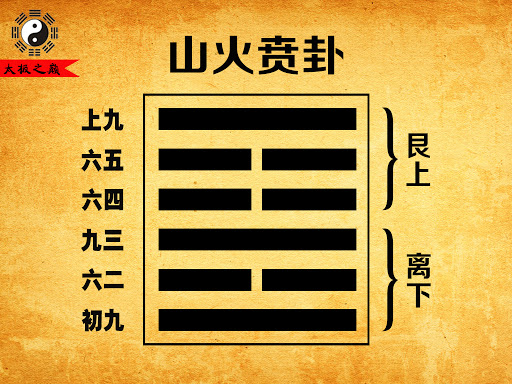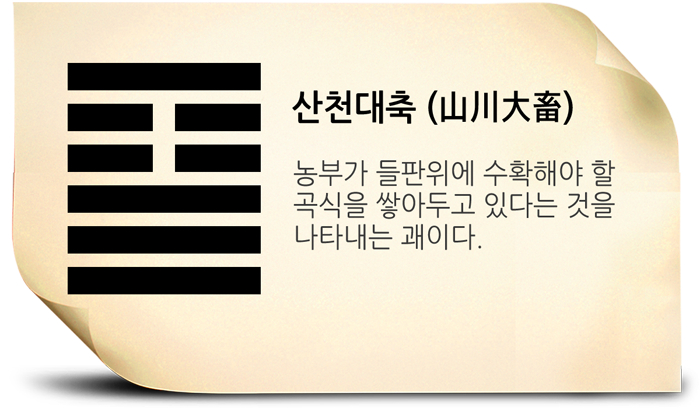
26_산천대축(山川大畜)
大畜利貞
(대축이정) : 대축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,
不家食吉
(부가식길) :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하니
利涉大川
(이섭대천) : 큰 내을 건넘이 이로우니라.
彖曰
(단왈) : 단에 이르기를
大畜
(대축) : 대축은
剛健篤實輝光
(강건독실휘광) : 강건하고 독실하고 빛나서
日新其德
(일신기덕) :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함이니,
剛上而尙賢
(강상이상현) : <강>이 올라가서 어진 이를 숭상하고,
能止健大正也
(능지건대정야) : 능히 굳건함을 그치게하니 크게 바름이라.
不家食吉
(부가식길) : '부가식길'은
養賢也
(양현야) : 어진 이를 기름이요,
利涉大川
(이섭대천) : '이섭대천'은
應乎天也
(응호천야) : 하늘에 응함이라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天在山中大畜
(천재산중대축) : 하늘이 산 가운데 있음이 <대축>이니
君子以多識前言往行以畜其德
(군자이다식전언왕행이축기덕) :
군자가 앞의 말과 간 행실을 많이 알아서 그 덕을 쌓느니라.
初九(초구) : 초구는
有利已(유이이) : 위태로움이 있으리니 그침이 이로우니라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有厲利已
(유려이이) : '유려이이'는
不犯災也
(부범재야) : 재앙을 범치 아니함이라.
九二
(구이) : 구이는
輿說輹
(여설복) : 수레의 바퀴살을 벗기도다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輿說輹中
(여설복중) : '여설복'은 중정함이라.
无尤也
(무우야) : 허물이 없느니라.
九三
(구삼) : 구삼은
良馬逐
(양마축) : 좋은 말로 쫓아감이니,
利艱貞
(이간정) :어렵게 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,
日閑輿衛
(일한여위) : 날로 수레와 호위를 익히면
利有攸往
(이유유왕) :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리라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利有攸往
(이유유왕) : '이유유왕'은
上合志也
(상합지야) : 위가 뜻을 합이다.
六四
(육사) : 육사는
童牛之梏
(동우지곡) : 어린 소의 뿔이니,
元吉
(원길) : 크게 길하니라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六四元吉
(육사원길) : '육사원길'은
有喜也
(유희야) : 기쁨이 있음이라.
六五
(육오) : 육오는
豶豕之牙吉
(분시지아길) : 불알 깐 돼지의 어금니니 길하니라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六五之吉
(육오지길) : '육오지길'은
有慶也
(유경야) : 경사가 있음이라.
上九
(상구) : 상구는
何天之衢亨
(하천지구형) : 어찌하여 하늘에 거니는가, 형통하다.
象曰
(상왈) : 상에 이르기를
何天之衢
(하천지구) : '하천지구'는
道大行也
(도대행야) : 도가 크게 행함이라
출처: https://hwalove.tistory.com/entry/26산천대축山川大畜?category=343349 [빈막(賓幕)]
26_산천대축(山川大畜)
음양오행의 원리_주역/역경(周易/易經) 26_산천대축(山川大畜) 大畜利貞(대축이정) : 대축은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, 不家食吉(부가식길) : 집에서 먹지 아니하면 길
hwalove.tistory.com
'중국고전 > 易經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주역(周易) 28.택풍대과(澤風大過) (0) | 2021.02.08 |
|---|---|
| 주역(周易) 27.산뢰이(山雷頤) (0) | 2021.02.08 |
| 주역(周易) 24.지뢰복(地雷復) (0) | 2021.02.08 |
| 주역(周易) 23.산지박(山地剝) (0) | 2021.02.08 |
| 주역(周易) 22.산화비(山火賁) (0) | 2021.02.08 |